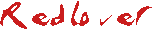연생이의 부모이고, 지금은 실종된(ㅠ.ㅠ)장군이와 츄츄

▲ 새끼 5마리를 낳고 눈빛까지 촉촉해진 츄츄 (2004.03.13)
강아지들이 태어난건 12일 저녁부터. 한마리씩 낳기 시작하더니 새벽까지 출산이 이어졌었다. 엄마가 되는 과정은 어찌나 힘겨운지..
새끼들 건사하는게 얼마나 바지런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른다.
유전의 신비~로 연생이는 점점 츄츄를 닮아간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격은 장군이를 닮았다는 것. 예를 들어 특이한 먹을 것을 주면 츄츄는 그게 뭔지 확인도 안하고 덮어놓고 삼킨다.--; 그런데, 장군이는 그게 처음 보는 종류의 것이라면 냄새를 맡아보고, 살짝 맛을 보고 한참을 경계하다가 비로소 집어먹는다. 그런데, 연생이는 장군이 정도의 경계는 아니더라도 살펴보고 음식도 그냥 삼키는게 아니라 씹어먹는다. 그리고 털 결이 츄츄는 좀 뻣뻣하고, 장군이는 보송보송한 느낌이었는데, 연생이는 장군이 같은 털을 가졌다.

▲ 절로 웃음짓게 만드는 표정의 장군이(2004.03)
풍산개 수컷은 특이하게도 2~3년이 지나야 귀가 쫑긋하게 선다고 한다. 저때는 11개월쯤 됐을때 사진이다. 츄츄는 임신한 상태였으니까, 이미 어른;
장군이는 4월에 집을 나갔는데, 원인은 집나간 마누라를 찾아서 OTL
큰집 식구가 놀러와서 부주의하게 대문을 열어놔서 츄츄가 집을 나갔다. 그리고 일주일뒤에 장군이가 담을 뛰어넘었다. 두 마리 다 집밖은 거의 나가본 적이 없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ㅠ.ㅠ
장군이와 츄츄를 마당에서는 풀어키우면서 집밖에는 내보내지 않았던건, 그 전 해에 개 3마리를 한꺼번에 잃었던 일이 있어서 였다. 토돌이는 교통사고, 지니와 2호는 쥐약묻은 돼지고기를 집어먹고 죽어버렸다. 따지자면 관리소홀이었지만, 쥐약 놓는다고 알려주기만이라도 했다면 그런 변은 당하지 않았을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강아지 3마리를 한꺼번에 잃고 들여온 장군이와 츄츄였기에 집밖에는 아예 내놓지를 않았는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이야.
그 뒤로 연생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산책을 데리고 다녔다. 어디가도 집은 찾아서 오라고.

▲ 새끼 5마리를 낳고 눈빛까지 촉촉해진 츄츄 (2004.03.13)
강아지들이 태어난건 12일 저녁부터. 한마리씩 낳기 시작하더니 새벽까지 출산이 이어졌었다. 엄마가 되는 과정은 어찌나 힘겨운지..
새끼들 건사하는게 얼마나 바지런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른다.
유전의 신비~로 연생이는 점점 츄츄를 닮아간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격은 장군이를 닮았다는 것. 예를 들어 특이한 먹을 것을 주면 츄츄는 그게 뭔지 확인도 안하고 덮어놓고 삼킨다.--; 그런데, 장군이는 그게 처음 보는 종류의 것이라면 냄새를 맡아보고, 살짝 맛을 보고 한참을 경계하다가 비로소 집어먹는다. 그런데, 연생이는 장군이 정도의 경계는 아니더라도 살펴보고 음식도 그냥 삼키는게 아니라 씹어먹는다. 그리고 털 결이 츄츄는 좀 뻣뻣하고, 장군이는 보송보송한 느낌이었는데, 연생이는 장군이 같은 털을 가졌다.

▲ 절로 웃음짓게 만드는 표정의 장군이(2004.03)
풍산개 수컷은 특이하게도 2~3년이 지나야 귀가 쫑긋하게 선다고 한다. 저때는 11개월쯤 됐을때 사진이다. 츄츄는 임신한 상태였으니까, 이미 어른;
장군이는 4월에 집을 나갔는데, 원인은 집나간 마누라를 찾아서 OTL
큰집 식구가 놀러와서 부주의하게 대문을 열어놔서 츄츄가 집을 나갔다. 그리고 일주일뒤에 장군이가 담을 뛰어넘었다. 두 마리 다 집밖은 거의 나가본 적이 없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ㅠ.ㅠ
장군이와 츄츄를 마당에서는 풀어키우면서 집밖에는 내보내지 않았던건, 그 전 해에 개 3마리를 한꺼번에 잃었던 일이 있어서 였다. 토돌이는 교통사고, 지니와 2호는 쥐약묻은 돼지고기를 집어먹고 죽어버렸다. 따지자면 관리소홀이었지만, 쥐약 놓는다고 알려주기만이라도 했다면 그런 변은 당하지 않았을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강아지 3마리를 한꺼번에 잃고 들여온 장군이와 츄츄였기에 집밖에는 아예 내놓지를 않았는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이야.
그 뒤로 연생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산책을 데리고 다녔다. 어디가도 집은 찾아서 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