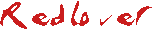출처 - hm³SPECIAL Vol.45 (2007년 4월호)

[獄楽] 스페셜 롱 인터뷰
『獄楽』를 해오면서 도움받은 일도 있다고 할까
- 『獄楽』도 7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과 문장에 충격을 받았어요. 엄격하다고 할까, 다크한 느낌이라고 할까. 하지만, 때때로, 본격적인 듯한 분위기도 있어서. 미키 상의 사상이 스트레이트로 담겨있구나, 하고 생각했었고….
기본적으로 언더그라운드적인 사람이니까 (웃음). 연재를 시작할 때에, 그저 그런 그라비아 기사로는 싫다, 고 생각해서. 성우라는 "목소리뿐인 일"이라고 해도, 뭔가 만들어 내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단지 사진 찍히는 것뿐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 안에 존재하는 것을 꺼내지 않으면 안 돼,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로는 안되라고 말이죠. 역시, 본격적인 아이돌과 비교해보면, 당연히 외관상 이길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목소리뿐" 으로 성립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잡지에도 픽업되는 거에요. 귀가 불편한 사람에게 있어 성우 잡지라는 것은 의미불명이겠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가지 않으면 안 돼~라고 생각해.
- 보면서 느낀 것이, 보통의 인터뷰나 칼럼과는 다르구나 했어요. 미키 상의 그때그때의 "심정"이 사진에 담겨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면을 읽는다고 하기보다 영상을 보는 감상에 가깝다고 할까요.
(『그 셋』대사가 교차하는 부분을 보면서)나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 떠오르는 문장을 그대로 형태로 한 느낌이니까요. 쓰인 문장을 소리 내 읽어봐도 좋다고 생각해요.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기분 좋은 리듬에 빠져들도록 쓸 작정이었고.
- 그런 때때로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먼저 이미지가 결정된 것도 있다면, 로케 장소가 미리 정해져서 그 이미지로 만들거나, 완성된 사진을 보고 떠오른 문장도 있거나 해요. 『그 서른둘』은 처음으로 로케 장소가 결정돼서, 거기에 가서 떠오른 이미지. 짧은 무대를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사진도 조금 색다른 풍으로 해주셨고. 책에 토모카즈와 함께 촬영했던 『보물상자(宝箱)』(2004년 9월 발매한 단행본에 수록)도, 옛날, 무대에서 하고싶다고 생각해서 쓴 대본 일부에요. 어째서 형이 "타누키(* 狸 : 너구리, 여기서는 た抜き : 타빼기)"인가 하면, "타"를 빼고……"타카라바코(* 宝箱 : 보물상자)"의 "타"를 빼면 "카라바코(* 空箱 : 빈 상자)"라고 전하고 싶었던 거에요. "토키오"는 "시간이 흐르지 않게 된 남자(* 時を刻めなくなった男)"라는 의미로. 1
- 『獄楽』는 탁 보면, 아까 미키 상이 말씀하신 것 같은 "언더그라운드" 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잘 읽어보면 깊은 메시지 성이 있는 거네요.
사실은 예전에, 「나, 죽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웃음)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바뀐 것도 있고, 『獄楽』를 해오면서 구원받은 부분도 있다고 할까나.
- "크락션"의 이야기 같은 거네요. 형태라는 것으로 내뿜어서, 미키 상 자신이 기분을 재확인했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아, 그럴지도. 응, 재확인했다는 것일지도.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자신의 일만으로 여유가 없었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한계까지 꽉 찼던 것이, 연령과 함께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겨서. 『獄楽』자체도, 시계가 넓어진 가운데 볼 수 있을만한 물건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막이 있다고 한다면 제1막은 나의 젊은 시절로, 조금씩 인상이 변해간다는 정도이니까 제2막에 막 들어서면서는……하고 생각해요.
「그때, 나는 저런 풍으로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꼴사나우니까
-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다가 행복했다가 즐기는 여유라고 할까, 그 앞에 행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알고있는 분위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말로 미키 상의 꾸미지 않은 마음이 쓰여있어서, 그러기에 다이렉트하게 전해져오는구나, 라는 느낌.
응. 보통의 인터뷰나 칼럼이었다고 하면, 실제로 진짜 기분을 전할 수 있었을지 어떨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늘 생각하고 있는 건 「틀에 맞추고 싶지 않아」라는 것.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도, 틀에 맞춰지고 마는 사람 쪽이 많지요. 나도 그럴지 몰라. 하지만, 나는 허용된 동안에, 허용된 범위의 일은 해 나가고 싶어. 그 자리에 있는 자신, 그 자리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보내면 어떤가, 하고. 나이를 먹고 나서「그때, 나는 저런 풍으로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꼴사납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말야, 달리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건 없는 걸까나. 누군가가 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만둬도 좋겠지만 (웃음)
- 아니 아니(웃음). 그러나 누구도 하지 않은 것은, 두렵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심정을 숨기지 않고 토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읽는 측에서 받아들이는 인상이 변해가서. 그 결과, 본인의 이미지도 변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그건 어떤 일이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이란 것도 그래. 잘하고 못하는 것의 차는 다소 있지만, 테이크를 거듭해서 OK 한 것이 세상에 나오는 걸지도 모르고, 한 번에 OK 한 것이 세상에 나올지도 몰라. 몇 번이고 테이크를 거듭한 것이라도, 최종적으로는 음향감독이 OK를 낸 부분밖에 유저의 귀에는 닿지 않아. 테이크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작품을 본 사람으로부터는 「잘한다」고 평가받는 거에요. 한 번에 OK 테이크를 낸 사람과 나란히 서게 돼. 그렇게 되면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나, 하는 그런 거. 그것과 같이, 형태가 된 단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알 수 없고, 확실히 두려울지도 모르겠네. 『獄楽』는……. 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걸까나.
- 보는 사람의 기분에 링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지적받은 것처럼 덜컹하고 찔리는 면도 있다면, 이런 사고방식도 있는 건가 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 같은 일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서로 비춰보고, 반성하거나, 용기를 북돋거나 하는 일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고백하자면, 3회 정도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요. (웃음). 문자를 보고, 사진을 보고, 다시 한 번 문자를 읽었을 때 '아, 그런가' 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겠네(웃음). 지금은, 모두 곧장 정답을 원하고 있지요? 수단도 많고, 정보가 많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정답에 도달하기까지의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바로 알고 싶어해. 인터넷에서 쇼핑을 한다든가,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다든가 알기 쉬운 예지만,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프로세스가 없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고한다는 행위가 쓸모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들 하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마는.
- 하지만, 그래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 과정이 재미있는 거고, 양식이 되는 것인데.
응,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애니에서도, 보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역으로 나는 100% 말하고 싶은 것을 전부 말할 필요는 없잖아, 는 거지. 조금 시간을 두고 되풀이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거기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변해간다고 생각하니까.
- 보는 것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감상법이 달라서 좋다고 생각해요. 정답이 하나일 필요는 없고 말이에요. 실제 『獄楽』를 보고 「그래서, 미키 상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지?」하고 머리를 쥐어짜는 사람도 많을 거에요. (웃음)
분명히 많이 있을 거에요. (웃음) 이 연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獄楽』를 보는 것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자신이 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일 테니까…
- 분명히 그런 사람은, 「도대체 『獄楽』라는 건 무슨 의미?」 라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을 거에요. (웃음)
『獄楽』라는 타이틀은 만들어낸 단어라서. 태어난 이상, 자신의 육체라고 하는 그릇으로부터 나갈 수 없어. 지금 우리가 떠드는 것, 그것은 뇌가 사고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하다 보면 명확하게 존재를 알 수 없지요.
그렇다면, 자신이라고 하는 개인의 존재를 허용해주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거부했다면, 이미 이 세상에 자신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 무심코 잘 잊어버리고 말지만, 그것을 허용해 준 육체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만, 스스로는 그 주박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불가능해. 그렇다고 해서, 초조하게 굴어서 끝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끝내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마는 자신이 있다면, 앞을 보는 자신도 있어. 『그 삼십칠』이 그것을 의식해서 만든 것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나.」랄까. 그러니까 땅에는 스플래터스러운 것을 집어넣어 줬다. 전쟁이 있다든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다거나, 어두운 일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를 「근사했구나.」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지 아니한가 라는 것. 나 말인데 알레르기가 있어서, 진짜로 힘든 것도 있고, 「내일도 눈 뜨는 것이 가능하려나.」하고 생각한 적도 있고, 잠드는 것이 무서운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나라도 확실히 일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했어요. 똑같이 알레르기라거나, 아토피 같은 거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 여자아이라면 더더욱 고통스러울 거로 생각하지만, 충분히 일은 할 수 있어요, 라는. 성우는 원래라면 얼굴을 내비치지 않는 일이고, 애니가 좋아서, 연기가 좋아서, 배우를 동경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해 보세요, 하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테마 중 하나로 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 단순하게 생각해도, 겉보기뿐이었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했다면 7년이나 연재가 계속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자기 자신을 멋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멋져지고 싶어.」라고 생각하며 쭉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 제1회째부터 되돌아 보면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쭉 이 일을 해오면서 하고 싶은 것의 기본은 변하지 않았지만, 연령이 쌓이는 분만큼, 나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을 테니까.
옛날과 지금으로 변하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되돌아 보니 「예전에는 무척 미숙한 내가 있었구나.」 하고 느꼈어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버렸어. (웃음) 라고 해도, 당시에 끝까지 응석부리고 있었다면, 지금 아무것도 남겨 두지 못했을 거에요. 오해한 채, 자신의 과거를 품고 가는 것이 돼. 추억은 자기가 조작할 수 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獄楽』에서 그때그때의 자신의 생생한 기분, 에둘러 완곡하게 말한 것이 아닌 발언을 남겨두고 갈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지도 몰라요.
- 미키 상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바로 정면에서부터 깊이 파고들어 가시는군요. (웃음) 굉장히 똑바로 자신과 마주 대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건 정말 고마운 감상일지도. 멋지게 폼을 잡고, 그럴듯한 것을 말하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자신을 감춰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반대로 그런 사람은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해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분 좋게 지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일순의 자신만을 좋아해 봐야 과거의 자신을 지울 수 없는 일이고. 과거의 자신이 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라도, 전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위에 나도 또 나이를 거듭 쌓아가는 거고. 앞으로 어딘가에서 그런 자신을 보여줄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철두철미(徹頭徹尾)>의 7년간. 독자 여러분, TEAM 獄楽의 스태프 여러분, 오랜 기간 어울려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이번으로 『獄楽』는 마지막회 2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언가 느낀 것이 있었다면 무척 기쁘겠습니다. 깊이 감사! 81PRODUCE 스즈키 코타(鈴木孝太)
* 감상을 대신한 번역 후기.

[獄楽] 스페셜 롱 인터뷰
『獄楽』를 해오면서 도움받은 일도 있다고 할까
- 『獄楽』도 7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과 문장에 충격을 받았어요. 엄격하다고 할까, 다크한 느낌이라고 할까. 하지만, 때때로, 본격적인 듯한 분위기도 있어서. 미키 상의 사상이 스트레이트로 담겨있구나, 하고 생각했었고….
기본적으로 언더그라운드적인 사람이니까 (웃음). 연재를 시작할 때에, 그저 그런 그라비아 기사로는 싫다, 고 생각해서. 성우라는 "목소리뿐인 일"이라고 해도, 뭔가 만들어 내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단지 사진 찍히는 것뿐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 안에 존재하는 것을 꺼내지 않으면 안 돼,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로는 안되라고 말이죠. 역시, 본격적인 아이돌과 비교해보면, 당연히 외관상 이길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목소리뿐" 으로 성립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잡지에도 픽업되는 거에요. 귀가 불편한 사람에게 있어 성우 잡지라는 것은 의미불명이겠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가지 않으면 안 돼~라고 생각해.
- 보면서 느낀 것이, 보통의 인터뷰나 칼럼과는 다르구나 했어요. 미키 상의 그때그때의 "심정"이 사진에 담겨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면을 읽는다고 하기보다 영상을 보는 감상에 가깝다고 할까요.
(『그 셋』대사가 교차하는 부분을 보면서)나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 떠오르는 문장을 그대로 형태로 한 느낌이니까요. 쓰인 문장을 소리 내 읽어봐도 좋다고 생각해요.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기분 좋은 리듬에 빠져들도록 쓸 작정이었고.
- 그런 때때로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먼저 이미지가 결정된 것도 있다면, 로케 장소가 미리 정해져서 그 이미지로 만들거나, 완성된 사진을 보고 떠오른 문장도 있거나 해요. 『그 서른둘』은 처음으로 로케 장소가 결정돼서, 거기에 가서 떠오른 이미지. 짧은 무대를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사진도 조금 색다른 풍으로 해주셨고. 책에 토모카즈와 함께 촬영했던 『보물상자(宝箱)』(2004년 9월 발매한 단행본에 수록)도, 옛날, 무대에서 하고싶다고 생각해서 쓴 대본 일부에요. 어째서 형이 "타누키(* 狸 : 너구리, 여기서는 た抜き : 타빼기)"인가 하면, "타"를 빼고……"타카라바코(* 宝箱 : 보물상자)"의 "타"를 빼면 "카라바코(* 空箱 : 빈 상자)"라고 전하고 싶었던 거에요. "토키오"는 "시간이 흐르지 않게 된 남자(* 時を刻めなくなった男)"라는 의미로. 1
- 『獄楽』는 탁 보면, 아까 미키 상이 말씀하신 것 같은 "언더그라운드" 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잘 읽어보면 깊은 메시지 성이 있는 거네요.
사실은 예전에, 「나, 죽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웃음)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바뀐 것도 있고, 『獄楽』를 해오면서 구원받은 부분도 있다고 할까나.
- "크락션"의 이야기 같은 거네요. 형태라는 것으로 내뿜어서, 미키 상 자신이 기분을 재확인했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아, 그럴지도. 응, 재확인했다는 것일지도.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자신의 일만으로 여유가 없었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한계까지 꽉 찼던 것이, 연령과 함께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겨서. 『獄楽』자체도, 시계가 넓어진 가운데 볼 수 있을만한 물건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막이 있다고 한다면 제1막은 나의 젊은 시절로, 조금씩 인상이 변해간다는 정도이니까 제2막에 막 들어서면서는……하고 생각해요.
「그때, 나는 저런 풍으로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꼴사나우니까
-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다가 행복했다가 즐기는 여유라고 할까, 그 앞에 행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알고있는 분위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말로 미키 상의 꾸미지 않은 마음이 쓰여있어서, 그러기에 다이렉트하게 전해져오는구나, 라는 느낌.
응. 보통의 인터뷰나 칼럼이었다고 하면, 실제로 진짜 기분을 전할 수 있었을지 어떨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늘 생각하고 있는 건 「틀에 맞추고 싶지 않아」라는 것.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도, 틀에 맞춰지고 마는 사람 쪽이 많지요. 나도 그럴지 몰라. 하지만, 나는 허용된 동안에, 허용된 범위의 일은 해 나가고 싶어. 그 자리에 있는 자신, 그 자리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보내면 어떤가, 하고. 나이를 먹고 나서「그때, 나는 저런 풍으로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꼴사납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말야, 달리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건 없는 걸까나. 누군가가 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만둬도 좋겠지만 (웃음)
- 아니 아니(웃음). 그러나 누구도 하지 않은 것은, 두렵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심정을 숨기지 않고 토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읽는 측에서 받아들이는 인상이 변해가서. 그 결과, 본인의 이미지도 변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그건 어떤 일이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이란 것도 그래. 잘하고 못하는 것의 차는 다소 있지만, 테이크를 거듭해서 OK 한 것이 세상에 나오는 걸지도 모르고, 한 번에 OK 한 것이 세상에 나올지도 몰라. 몇 번이고 테이크를 거듭한 것이라도, 최종적으로는 음향감독이 OK를 낸 부분밖에 유저의 귀에는 닿지 않아. 테이크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작품을 본 사람으로부터는 「잘한다」고 평가받는 거에요. 한 번에 OK 테이크를 낸 사람과 나란히 서게 돼. 그렇게 되면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나, 하는 그런 거. 그것과 같이, 형태가 된 단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알 수 없고, 확실히 두려울지도 모르겠네. 『獄楽』는……. 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걸까나.
- 보는 사람의 기분에 링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지적받은 것처럼 덜컹하고 찔리는 면도 있다면, 이런 사고방식도 있는 건가 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 같은 일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서로 비춰보고, 반성하거나, 용기를 북돋거나 하는 일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고백하자면, 3회 정도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요. (웃음). 문자를 보고, 사진을 보고, 다시 한 번 문자를 읽었을 때 '아, 그런가' 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겠네(웃음). 지금은, 모두 곧장 정답을 원하고 있지요? 수단도 많고, 정보가 많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정답에 도달하기까지의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바로 알고 싶어해. 인터넷에서 쇼핑을 한다든가,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다든가 알기 쉬운 예지만,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프로세스가 없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고한다는 행위가 쓸모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들 하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마는.
- 하지만, 그래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 과정이 재미있는 거고, 양식이 되는 것인데.
응,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애니에서도, 보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역으로 나는 100% 말하고 싶은 것을 전부 말할 필요는 없잖아, 는 거지. 조금 시간을 두고 되풀이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거기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변해간다고 생각하니까.
- 보는 것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감상법이 달라서 좋다고 생각해요. 정답이 하나일 필요는 없고 말이에요. 실제 『獄楽』를 보고 「그래서, 미키 상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지?」하고 머리를 쥐어짜는 사람도 많을 거에요. (웃음)
분명히 많이 있을 거에요. (웃음) 이 연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獄楽』를 보는 것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자신이 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일 테니까…
- 분명히 그런 사람은, 「도대체 『獄楽』라는 건 무슨 의미?」 라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을 거에요. (웃음)
『獄楽』라는 타이틀은 만들어낸 단어라서. 태어난 이상, 자신의 육체라고 하는 그릇으로부터 나갈 수 없어. 지금 우리가 떠드는 것, 그것은 뇌가 사고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하다 보면 명확하게 존재를 알 수 없지요.
그렇다면, 자신이라고 하는 개인의 존재를 허용해주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거부했다면, 이미 이 세상에 자신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 무심코 잘 잊어버리고 말지만, 그것을 허용해 준 육체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만, 스스로는 그 주박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불가능해. 그렇다고 해서, 초조하게 굴어서 끝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끝내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마는 자신이 있다면, 앞을 보는 자신도 있어. 『그 삼십칠』이 그것을 의식해서 만든 것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나.」랄까. 그러니까 땅에는 스플래터스러운 것을 집어넣어 줬다. 전쟁이 있다든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다거나, 어두운 일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를 「근사했구나.」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지 아니한가 라는 것. 나 말인데 알레르기가 있어서, 진짜로 힘든 것도 있고, 「내일도 눈 뜨는 것이 가능하려나.」하고 생각한 적도 있고, 잠드는 것이 무서운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나라도 확실히 일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했어요. 똑같이 알레르기라거나, 아토피 같은 거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 여자아이라면 더더욱 고통스러울 거로 생각하지만, 충분히 일은 할 수 있어요, 라는. 성우는 원래라면 얼굴을 내비치지 않는 일이고, 애니가 좋아서, 연기가 좋아서, 배우를 동경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해 보세요, 하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테마 중 하나로 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 단순하게 생각해도, 겉보기뿐이었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했다면 7년이나 연재가 계속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자기 자신을 멋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멋져지고 싶어.」라고 생각하며 쭉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 제1회째부터 되돌아 보면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쭉 이 일을 해오면서 하고 싶은 것의 기본은 변하지 않았지만, 연령이 쌓이는 분만큼, 나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을 테니까.
옛날과 지금으로 변하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되돌아 보니 「예전에는 무척 미숙한 내가 있었구나.」 하고 느꼈어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버렸어. (웃음) 라고 해도, 당시에 끝까지 응석부리고 있었다면, 지금 아무것도 남겨 두지 못했을 거에요. 오해한 채, 자신의 과거를 품고 가는 것이 돼. 추억은 자기가 조작할 수 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獄楽』에서 그때그때의 자신의 생생한 기분, 에둘러 완곡하게 말한 것이 아닌 발언을 남겨두고 갈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지도 몰라요.
- 미키 상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바로 정면에서부터 깊이 파고들어 가시는군요. (웃음) 굉장히 똑바로 자신과 마주 대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건 정말 고마운 감상일지도. 멋지게 폼을 잡고, 그럴듯한 것을 말하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자신을 감춰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반대로 그런 사람은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해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분 좋게 지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일순의 자신만을 좋아해 봐야 과거의 자신을 지울 수 없는 일이고. 과거의 자신이 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라도, 전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위에 나도 또 나이를 거듭 쌓아가는 거고. 앞으로 어딘가에서 그런 자신을 보여줄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철두철미(徹頭徹尾)>의 7년간. 독자 여러분, TEAM 獄楽의 스태프 여러분, 오랜 기간 어울려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이번으로 『獄楽』는 마지막회 2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언가 느낀 것이 있었다면 무척 기쁘겠습니다. 깊이 감사! 81PRODUCE 스즈키 코타(鈴木孝太)
* 감상을 대신한 번역 후기.
- 역시 미키 상의 어법은 따라가기 어렵다. OTL 화제를 넘나드는 것도 그렇고, 안에 간직하고 있는 생각이 심오해서 그런가 말씀하시는 것도 참 어렵다.
- 고쿠라쿠는 38회로 연재 끝. 미키 상, 2006년 38세. 우연의 일치였을까나.
- 미키 상의 수수께끼.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해석의 여지를 준다는 건,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아자씨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는데. 하기는 원래 그런데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었으니까.
-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자씨는 얼마나 용감한 분이신지요. 비겁한 파슨이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눈을 돌리고 싶답니다. あぁ, 逃げちゃだ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