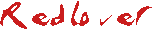일 시 : 2011. 12. 03 ~ 2012. 01. 29
장 소 : 연우 소극장
관극일 : 2012. 01. 11 (수) 20:00
연 출 : 김운기, 대본 : 이희준, 음악감독 : 이보미
캐스트 : 홍규/레옹 - 윤석원, 원표/피에르 - 박성환, 서도/마리안느 - 문진아
줄거리 :
1884년 한성, 개혁을 꿈꾸는 홍규와 원표 앞에 나타난 여인 서도.
그녀가 원표에게 건넨 한 권의 책 속엔 1789년 혁명을 잉태한 프랑스 파리가 펼쳐진다.
프랑스 혁명 속의 세 사람 - 레옹과 피에르 그리고 마리안느.
갑신정변 속의 세 사람, 홍규와 원표, 그리고 서도.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이들의 뜨거운 삶. 과연 운명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출처 > 플레이DB]
- 지인들 평이 좋아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기대를 하지 말 것을 그랬는가보다. 항상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잘 조절이 안된다. 아니, 소극장 뮤지컬이라 그렇게 큰 기대를 한 것도 없었는데, 난 도대체 뭘 기대했던거지? 아, 넘버가 좋다고 했던거 같은데, 난 솔직히 오늘 음악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구나;;
아, 이게 극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내가 오늘 극에 집중을 전혀 못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 같다. 배우 셋에 소품이라고는 테이블 하나에 의자 2개 뿐인 단촐한 무대인데, 그 작은 공간을 이용하려 배우들의 동선은 정신이 없었고, 조명은 대극장급으로 현란하고, 소극장인데 라이브 반주를 들려주려는 의도는 정말 훌륭했지만, 음향 설계의 문제인지 윤석원 배우 노래, 대사는 간혹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쩐지 비슷한 리듬과 멜로디로 전개되는 넘버들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두 개의 혁명과 두 개의 삼각관계가 교차되는 연출은 꽤 괜찮은 시도였다. 환생 코드를 넣은 건지, 평행 이론을 써먹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게 지루함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이랄까. 그리고 제목은 '혁명'이나 이 뮤지컬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사랑'인 것 같다.
- 배우들의 연기는 박성환 씨가 초반 피에르에 좀 더디게 몰입이 진행된 걸 빼면 다들 자기 캐릭터에 잘 맞춰서 연기 하신다. 넘버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건 별개로 치고 안정감 있게 노래도 잘 하신다. 그런데 나에겐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
등장해서 혁명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윤석원 씨는 초장부터 눈물을 가득 매달고 비참한 민중의 삶에 분노하는데, 나는 아직 극 속으로 몰입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을 뿐이고; 이 당황스러움이 관극하는 내내 나를 방관자로 만들어서 어느 캐릭터에도 이입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바로 코앞에서 너무 절절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감정들이 마치 유리벽에 튕겨지듯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게 너무 슬펐다. ㅠ.ㅠ
-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이카루스의 날개를 부르던 박성환 씨, 그리고 극의 마지막, 원표의 눈에 보이는 레옹과 마리안느의 모습. 거기서마저 외면당하는 원표이자 피에르인 박성환 씨의 눈물 연기가 가장 인상깊었다. 사실, 연기 자체는 윤석원 씨의 연기가 좀 더 감정선이 좋았던 것 같은데, 박성환 씨는 딱 그 부분에서 포텐이 터지셔서. 문진아 씨는 예쁘시고, 노래도 꾀꼴하게 잘 하시고, 연기도 뭐 캐릭터에 맞춰 잘 하셨지만 마리안느가 레옹에게 끌리는 건 이해가 가도, 서도가 홍규에게 끌리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 피에르와 레옹은 귀족과 혁명가로 서로 신분도 신념도 달랐지만, 원표와 홍규는 어쨌든 같은 편이었는데, 서도는 왜 원표가 아닌 홍규에게 끌렸을까. 환생 코드 쪽인 건가?
- 현매하면 티켓도 예쁜 걸 준다고해서, 사실 오늘 공연은 인팍에서 예매하고, 보고 좋으면 다음엔 현매를 할까 했는데, 다시 보러갈 것 같지는 않아서 당황스럽다.
+ 추기
하루 지나고 가만 생각해봤다. 왜 별로였을까. 뭐, 하루 지난 다음이지만 멜로디 라인이 하나도 생각 안나는 음악이라던가. 음악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난 시종일관 시끄럽다고 느꼈어서;; 소극장에 대극장 배우들 데려다 놓은 것 같이 성량 자랑하는 고음부, 그리고 소리는 큰데 정작 내용은 안들리는 그런 답답함.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나한테는 홍규라는 캐릭터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게 컸다.
레옹은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귀족들이 하하호호 즐길 때 빵 한쪼가리 먹지 못했고, 아버지는 감옥에서 동상에 걸려 발을 잘라야했고, 동생은 굶어죽었다. 그에게 혁명은 사회를 바꾸자는 거창한 신념 이전에 분노의 발산이었고, 악에 받친 마지막 외침이었다. 그렇게 눈이 시뻘게져서 다 뒤집어엎자는 그 앞에 아주 전형적인 귀족 아가씨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 그 향기에 끌릴 수 밖에 없었을 레옹의 혼란스러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귀족 집안에 태어나 귀족의 삶 밖에 모르던 그녀 앞에 서민의 비참한 삶을 들이민 레옹의 존재는 신선한 충격과 각성을 가져다 줬을 것이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 그게 마리안느의 혁명이라면 혁명이겠지. 그래서 마리안느가 레옹에게 끌리는 것도, 레옹이 마리안느에게 끌리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홍규라는 캐릭터는 심하게 말하면 무모한 행동파라고 할지. 생각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는 타입이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그의 행동에는 어떤 계획도 없고, 일관성 같은게 전혀 없다. 레옹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연애 소설이라 비하했다가, 나중엔 그 안에 깔린 혁명은 읽지 못하냐고 버럭대는 너무나 모순이 많은 인물이다. 무엇보다 왕후전에 대책없이 쳐들어가 들킨 것 같다고 대뜸 총부터 들이대는 꼴이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도대체 똑똑한 서도는 뭘 보고 홍규에게 끌린 거지? 그냥 홍규는 레옹의 환생이니까? 음, 알 수 가 없다.
난 주인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극에 집중이 안되는 타입이라, 그래서 나한테는 별로였나보다.